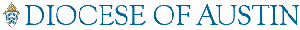|
<a href="https://kyoyoyo.com/towel/"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수건제작" id="goodLink" class="seo-link">수건제작</a>봄이 되면 넓은 정원에 벚꽃잎이 흩날렸다. 여름이면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매미 소리를 들었다. 학교가 끝나면 큰 운동장에서 축구나 농구, 술래잡기도 했다. 수요일 목욕 시간엔 친구들과 탕에 들어가 게임도 했다. “보육시설에서 살았다고 하면 ‘불행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편견이에요. 저는 보육시설에서 행복했거든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맡을 수 있는 특유의 공기가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이진희씨)
부산의 한 보육시설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이 된 20~30대 청년 8명이 최근 책 <이러려고 겨울을 견뎠나 봐>(호밀밭)를 펴냈다. 이들은 4년 전 후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을 돕는 모임 ‘몽실’을 결성하고 부산시 연제구에 같은 이름의 카페를 만들어 공동 운영하고 있다. 이 책에는 이들 여덟 청년이 각자의 아픔을 나름의 방식으로 치유해 나간 이야기가 담겼다. 여덟 명의 저자 가운데 카페 실무를 맡은 이진희씨(32)·박진솔씨(31)와 지난 1월 14일 영상회의 서비스 ‘줌’으로 대화했다. 두 사람은 보육시설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란 걸 안다”
이씨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밥그릇에 밥을 적게 퍼서, 혹은 술 취한 아버지의 설교를 듣다 졸았다는 이유로 맞아 “늘 여기저기 멍이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이씨 사정을 알게 된 학교 상담 선생님의 도움으로 보육시설에 가게 됐다. 이후의 변화에 대해 이씨는 이렇게 썼다. “아빠는 항상 화가 나면 내가 가장 아끼는 것부터 부쉈다. (중략) 난 아무것도 좋아할 수가 없었다. 가장 소중하면 먼저 망가진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시설에 들어와서야 무언가를 마음껏 좋아할 수 있었다.”
<이러려고 겨울을 견뎠나 봐>에서 여덟 청년은 각자의 아픈 사연을 담담한 목소리로 전한다. “1990년 10월의 어느 날, (갓 태어난) 나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전봇대 밑에 버려졌다”는 고백, 보육시설을 뛰쳐나와 울며 매달리는데도 “무슨 소리 하노, 다시 올라가”라며 외면하던 할머니에 대한 기억,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인연이 끊어진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품에 안겨있는 다른 아이를 보고 보육시설을 스스로 선택한 이야기 등을 저자들은 가감 없이 털어놓는다. 이들은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란 걸 안다.”
“숨길 이유가 없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힘든 시절이 있었어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었죠.”(이씨)
저자들은 자신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나갔다. “아이는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 자란다. (중략) 나도 분명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깨달음, “그 시절 우리에게 필요했던 따뜻한 어른이 돼 주고 싶다”는 소망, “보란 듯이 성장하겠다”는 다짐까지, 각자를 추스른 생각은 저마다 달랐지만 상통하는 데가 있다. 저자들은 아픔을 얘기하되 거기에 머무르려 하지 않았다. 저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한다. “여덟 살 때부터 ‘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라는 확신이 있었다. (중략) 늘 이어지는 질문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려고 겨울을 견뎠나 봐>는 못난 어른들 때문에 한때 불행했지만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끝내 내려놓지 않은 아이들의 성장기다. 행복한 추억이 많은 보육시설이었지만 선배들의 폭력적 신고식 등 잘못된 관행도 있었다. 저자들은 시설 내 부조리를 없애나가는 노력도 기울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