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으로 읽는 성인성녀전] (3) 글을 시작하며 ③
천국에서 영원불멸의 행복을 받고 계신 분
성인은 우리들의 신앙도덕에 모범이 될만한 사람
선종 후 시복·시성 되어야 진정한 성인 칭호 얻어
발행일 : 2009-10-25 [제2669호, 10면]
성인(聖人)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교회 안에서 성인이라고 부를 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존시에 극히 신앙이 두텁고 덕망이 많음으로써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사후에 하느님과 같이 있으면서 영원한 행복을 받고 계시는 분들. 특별히 성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천당에 확실히 계시다는 것을 판정선언(判定宣言)받은 분들.’
따라서 아무리 덕행이 뛰어난 이라도 성교회의 선언이 없는 한 결코 공공연하게 성인이라 부를 수 없다.
성인이라 함은 천국에 들어간 분들을 가리킨다고 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후 영혼의 거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이것을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성인을 결정하고 인지하는 것도 간접적인데,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계시(啓示)에 의해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도덕에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계시로 가르쳐주었다. 성모 마리아, 성 요셉, 요한 세례자 등이 이러한 분들이다. 물론 예수의 제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나머지 대부분의 성인은 하느님의 대리자인 성교회가 매우 엄격하고도 세밀한 조사를 하고서 판정선언(判定宣言)한 분들이다. 여기에 시복과 시성 두 가지가 있다. 시복된 분을 복자라고 하고, 시성된 분을 성인이라 칭한다.
라틴어로는 성인을 ‘상뚜스’(Sanctus)라고 한다. 상뚜스란 처음에는 ‘하느님께 봉헌된 거룩한 자’라는 의미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영세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받으며 하느님께 봉헌된 신자들이나, 신품성사를 받음으로써 하느님께 봉헌된 사제들, 신자의 가정 안에서 하느님께 봉헌된 어린아이들도 모두 ‘상뚜스’(거룩한 자)라고 불렀었다.
하지만 상뚜스는 차츰 천국에 계시는 분들만을 지칭하게 됐다. 아무리 신분이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위나 생활이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성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
또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변하기 쉬우므로 잠시 덕을 닦는다 하더라도 돌연 심한 유혹이 닥쳐오면 언제 어느 때 범죄하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을 성인이라 부르지 않고 죽어 천국에 들어가 영원불변의 행복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만 성인이라는 호칭을 붙여 부른다.
성인을 이야기할 때 빠트릴 수 없는 것이 초상에 그려진 후광 혹은 윤광이다. 성인 초상의 전신 혹은 머리 위에 광채를 그리는 것은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는 습관이다.
그리스도는 거룩한 말씀을 광명에 비유하고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한 9,5)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요한 12,46).
그리스도는 또한 빛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루카 16,8 요한 12,36 참조). 이런 이유로 선에 힘쓰는 성인의 상징으로 빛을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다. 불교에서도 부처님이나 보살의 초상에 후광을 그려 넣었다. 동서양을 떠나 후광은 영광이나 권능 있는 자를 표시하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화가(畵家)가 성인의 초상에 빛을 그리게 된 것은 5세기 무렵부터지만, 이 방법이 널리 사용된 것은 중세 이후다. 빛을 그리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초상의 전신을 빛으로 둘러싼 것이 ‘이우레울라’(후광)고, 머리 주위만 빛으로 두른 것이 ‘님부스’(윤광)다. 또 윤광도 원형(圓形)으로 하는 때도 있고 타원형(墮圓形)으로 하는 때도 있다.
또한 머리를 두르는 것도 있고, 머리 위에 좀 떨어지게 그리는 때도 있다.
후광이나 윤광은 아무리 성인이라는 소문이 떠돈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시복 시성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초상에 붙일 수가 없었다. 이것은 갈릴레이의 지동설을 인정한 교황으로 유명한 우르바노 8세(Urbanus VIII, 1568~1644)께서 정하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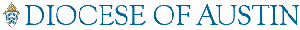


 [영성으로 읽는 성인성녀전] (3) 글을 시작하며 ③
[영성으로 읽는 성인성녀전] (3) 글을 시작하며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