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작가 선종 특집] 작가의 신앙과 작품세계
‘진정한 가톨릭 작가’ 원했던 이 시대 최고 글꾼
“가톨릭 정신이 내 사고, 내 의식에 인화”
영세 후 작품활동 뿌리 하느님에서 찾아
글쓸 때마다 ‘주님 허락’ 기대했던 ‘구도자’
발행일 : 2013-10-06 [제2864호, 16면]
고(故) 최인호 작가는 지난 1997년 가톨릭신문 창간 70주년 기념호 「가톨릭신문을 말한다」에서 “나 역시 가톨릭 신자라기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가톨릭 작가로 기록되어지기를,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감히 소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1998년 제1회 한국가톨릭문학상을 수상한 고인은 인터뷰에서 “세례 받은 후 가톨릭 정신이 내 사고, 내 의식에 인화된 것 같다”며 글쓰기 활동의 뿌리를 가톨릭 정신에서 찾았다.
고인은 1987년 영세 후 「왕도의 비밀」 「산문」 「길 없는 길」 「허수아비」 등 언뜻 가톨릭과 무관한 듯 보이는 역사와 종교, 사랑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많이 썼지만 작가 스스로 “이 모든 작업에 있어 가톨릭적 통찰로 보게 된다”고 말할 정도로 작품세계의 밑바닥에는 가톨릭 정신이 깔려있었다. 실제 경허 스님을 소재로 한 「길 없는 길」은 불교계에서도 인정할만큼 불교 사상을 꿰뚫고 경허 스님이라는 뛰어난 불자의 생애를 세상에 드러낸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뛰어난 한 불자를 세상에 드러낸 것도 결국 하느님의 섭리라고 생각한 작가는 스스로를 「불교적 가톨릭주의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가톨릭에 귀의한 후 ‘강렬한 빛을 받는 신앙체험’을 통해 새로운 눈을 뜬 작가의 신앙이 교회 매체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서울대교구 주보에 「말씀의 이삭」을 연재하면서부터였다. 이를 통해 고인은 역량 있는 작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믿음의 풍성한 양식을, 「말씀」의 의미를 더욱 친근하게 전해주기도 했다.
특히 작가의 작품 중에는 ‘가족’과 ‘어머니’를 소재로 한 작품들도 적잖아 그의 문학적 지향을 돌아보게 한다. 1975년부터 월간 「샘터」에 연재한 소설 ‘가족’을 통해 자신의 신앙과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를 썼으며, 지난 2001년에는 「어머니가 가르쳐 준 노래」(문예출판사)를 펴냈다. 또, 지난 2004년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추억과 그리움을 진솔한 글쓰기로 털어놓은 자전 소설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여백)를 출간해 깊은 울림을 전해주기도 했다. 암 투병 중이던 2011년에는 에세이집 「천국에서 온 편지」(누보)를 펴내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진한 그리움을 풀어내기도 했다.
작가의 신앙은 작품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다. 고인이 1998~1999년 ‘서울주보’에 연재한 글을 모아 지난 2000년 출간한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의 개정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열림원) 서문에서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숨결과 손으로 참견하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교묘히 참견하여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차라리 그러한 아버지를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필요 없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느님은 마침내 하늘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드리우게 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러한 그의 하느님 이해는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로 이어진다. 작가는 가톨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회 제반 문제의 근원은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부모의 말이나 행동이 아이들에겐 살아있는 교과서다. 아이들 문제가 곧 부모의 문제, 집안 전체의 문제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작가의 시대적 열정을 담은 「소설 공자」 「소설 맹자」(열림원/2012년)에서 그는 “공자가 살던 춘추시대와 그로부터 백년 후 맹자가 살던 전국시대가 오늘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가 살던 그 당시와 지금은 동시대라는 강렬한 인상을 느낀다. 무자비한 권력자, 거짓논리의 율법학자, 성전을 더럽히는 배금사상, 간음 현장, 진리를 못 박는 십자가 등 역설적으로 말하면 오늘날의 타락이 예수가 살던 어제의 그 시절의 광기와 다르지 않음으로서 진리(眞理)의 불변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공자와 맹자가 살던 춘추전국시대는 같은 동양권이어서 일지는 몰라도 예수가 살던 로마시대보다 오히려 더욱 오늘날의 현실과 닮아있음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는 고백은 작가의 정신세계가 문학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암과의 싸움에 들어가면서도 “과연 종교란 무엇인가”를 찾았던 작가, 글쓰기에 임할 때마다 “주님의 허락을 기대한다”고 했던 작가에게 글쓰기는 구도의 길이었다.
[이 게시물은 webmaster님에 의해 2014-03-15 12:04:22 우리의 신앙에서 이동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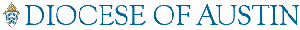


 [최인호 작가 선종 특집] 작가의 신앙과 작품세계
[최인호 작가 선종 특집] 작가의 신앙과 작품세계 



